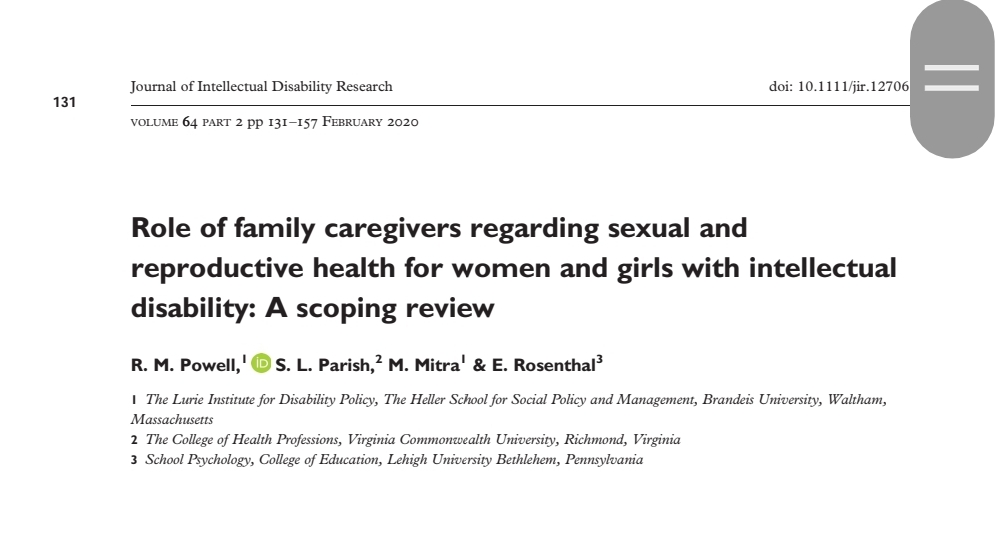소개
‘장루를 가진 상태에서 임신이 가능할까?’
‘나는 괜찮을까? 아이는?’
아마도 이는 장루를 가진 많은 젊은 여성들의 고민이리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아왔기에 의료진들조차 이들에게 어떤 조언도 쉽게 해주지 못했을 것이고, 장루가 있는 많은 여성들은 혼자 씨름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에 호주의 Ian Whiteley와 Janice Gullick은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나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으로 인해 장절제술을 받고 장루를 가진 채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호주 내 2개 대학병원의 장루 클리닉을 통해 모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전화 및 대면으로의 심층 인터뷰로 이루어졌고,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나요?
- 임신 중 경험한 것들을 말씀해주시겠어요?
- 장루 관련된 합병증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었나요?
- 장루를 가진 채로 임신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 임신 중 병원에서의 경험은 어땠나요?
- 임신 중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건 어떤 의미였나요?
- 임신 중 복부가 커지는 것에 대해 가졌던 염려가 있었나요?
- 임신 중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 임신 중 지지적인 사람이 있었나요? 그와의 경험은 어땠나요?
데이터 분석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함으로써 이루어졌고, Friederich Ast의 원형적인 접근법에 따라 한 사람의 일화를 이야기 전체에 대비하여 해석하거나, 전체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비하여 해석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도출된 테마 자체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현상학적 간호연구의 엄밀성을 위해 저자들은 Witt and Ploeg의 (2005) framework for rigour in phenomenological nursing research를 염두에 두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COREQ)를 기준에 두고 연구를 보고했다.
- De Witt, L., & Ploeg, J. (2006). Critical appraisal of rigour in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nursing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5(2), 215-229.
연구자들은 사전에 예측하고 있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미리 기술해둠으로써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참여자들은 임신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장루 관련 합병증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등).
연구 결과
1. 지옥 같았던 염증성 장질환
염증성 장 질환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고 여성들의 임신 경험의 밑바탕이 되었다. 참여자 중 6명은 염증성 장 질환이 매우 소모적이었기에, 장루를 갖기 전에는 임신을 차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진짜 정말 괴로웠어요. 하루에 스무번씩 변기에 앉아야 했고, 그때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통증이 빨리 해결되기만을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받았고, 전 훨씬 나아졌어요. “
한편 극복력이 생기기도 했다. “지옥을 가지만 결국 돌아오기도 하니, 어쨌든 아이는 갖고 싶었어요”
2. 생명줄 같은 장루
염증성 장 질환의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낸 여성들에게는 장루가 생명줄 같이 여겨졌다. 메를로-퐁티가 인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그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한다고 한 것 같이, 질병의 고통은 장루를 형성함으로 인해 나아졌고, 그 결과 자신을 ‘아픈 존재’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했다.
“난 크론병이 있으니 절대 임신을 못할 것 같았고, 임신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임신을 하면 저 자신도 못 돌볼 것이고, 아이도 못챙길것 같았거든요. 난 모든 약을 다 먹었고, 그건 아이에게 영향을 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나로부터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니,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 정상이고 싶은 마음.
참여자들에게 “정상”은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것이고, 임신 중 문제가 없는 것이었으며, 임신 중 그들 및 그들의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메를로-퐁티가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로서 자연과 문화적 세계 속으로 스스로를 투영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고 한 것 같이, 모성은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정상”이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임신을 함으로써 정상이길 원했다.
무려 일곱번의 유산을 경험한 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루를 가지고 있는건 문제가 안됐어요. 아이를 또 잃을 것이 두려웠죠. 임신을 한 후에야 정상이라고 느껴졌어요. 또 아이를 잃을 것이 무서웠어요.”
4. 미궁 속 임신 경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산부인과 의사를 포함하여 경력이 많은 의사조차 그들에게 그들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고, 장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자연분만이 가능할지 제왕절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일단 경험을 해야 그제서야 가까운 세계가 된다고 한 메를로-퐁티와 같이, 임신은 그들에겐 미궁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세번째 임신 중 쌍둥이 중 한 명을 뱃속에서 잃은 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주변의 누구도 장루와 임신에 대해 몰랐기에 저의 임신은 고위험으로 여겨지게 되었고..[마지막 아이가 사산되었을 때..]저는 이건 제 잘못이라고 느껴졌고, 내 몸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당연히 누구도 이에 대해 대답해주지 못했어요. 이건 크론병때문인가요, 아니면 장루때문인가요?”
5. 공간을 공유하는 태아와 질병
참여자들에게 뱃속의 아기는 소중했고, 그래서 배는 더 질병 같았다. 인식은 ‘가치의 통일’이며, 현실적으로 직면함으로써 드러나는 것 같이 (메를로 퐁티), 아기는 문제가 있는 곳 안에서 그 문제와 함께 키워야 하는 것 같이 인식되었고, 매일 장 질환과 함께 싸우며 임신하는 것에 대해 느끼게 되는 삶을 살게 했다.
한편, 어떤 참여자는 대장을 제거하고 장루를 형성하는 수술을 하고 나서 아기를 위한 공간이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제 임신은 생각보다 편했는데, 아마도 장이 없어서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넒어서 그런 것 같아요.”
6. 어두운 터널 같던 임신 기간
임신 기간은 여러 합병증을 감내하며 살아 내야 하는 기간이었다. 혹여라도 임신 중 뭔가 잘못되었을 때의 시간은 매우 느리게 갔고, 두려움이란 것이 모든 경험의 전경이 되었다. 그 기간은 오롯이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다.
“5주차는 지옥같았어요. 그래도.. 돌아올 수 있을거라 믿었어요. 전 제 삶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이 생각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았고,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
한편, 장루를 가진 임신 경험이 항상 부정적이었던 건 아니었다. 어떤 참여자는 장루를 가진 후의 첫 두 번의 임신을 매우 편하고 아름다웠던 경험으로 기억했으며, 어떤 참여자는 오히려 임신 중 더 건강한 것 같이 느꼈다고 하였다.
“그 때 전 정말 최상이었요. 제게 에너지는 넘쳤고, 문제가 없는 임산부인 것 같았아요.”
7. 신뢰할 수 없던 몸
많은 참여자들은 그들의 몸을 믿을 수 없었고, 이런 불신은 그들의 질환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몸이 임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임신을 감내할 수 있을지 두려웠고, 아이가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질환에 아이에게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였다.
그리고 장루도 걱정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어느 정도의 장루 문제가 발생하였다. 심각한 경우에는 장이 빠져나와 임신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장루 크기나 모양 변화 등이었으며 대부분 돌아왔다. 복부가 늘어나면서 파우치 옆으로 새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는 파우치를 단단하게 붙이거나, 허리까지 올라오는 속옷이나 하의를 최대한 밀착해서 입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한줄평
본 연구는 장루가 있는 여성의 임신 경험을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를 돕고, 향후 중재 개발 및 계획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기반하고 있으나, 신체의 현상학이 아주 잘 드러나는 연구는 아닌것으로 느껴짐. 신체의 현상학관점에서 장루를 가진 채 임신을 한 여성의 주관적 신체 경험에 대한 탐색 결과가 세밀하게 드러났으면 개인적으로는 더 흥미롭게 읽었을 것 같음.
Whiteley, I., & Gullick, J. (2018). The embodied experience of pregnancy with an ileostom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7(21-22), 3931–3944. https://doi.org/10.1111/jocn.14601